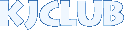- ”мХЉм±Д”лКФ мЭЉл≥ЄмЦімЧРмДЬ мШ® лІРмЭілѓАл°Ь “м±ДмЖМ”л•Љ мВђмЪ©нХімХЉнХЬлЛ§?
-> кЈЉк±∞мЧЖлКФ лВ≠мД§мЭілЛ§.
нХілЛєнХ≠л™© м∞Єм°∞вЖТ “мШ§лОЕ(гБКгБІгВУ)”мЭА мЭЉл≥ЄмЦі лЛ®мЦік∞А мЩЄлЮШмЦіл°Ь м†Хм∞©лРЬ к≤ГмЭіл©∞ мВђмЛ§ мЭЉл≥ЄмЧРмДЬ мІАмє≠нХШлКФ лМАмГБк≥Љ мЪ∞л¶ђк∞А мІАмє≠нХШлКФ лМАмГБлПД мДЬл°Ь лЛ§л•ілЛ§. мЭЉл≥ЄмЦі “мШ§лОЕ”мЭА мЦілђµ, лђµ, мЬ†лґА, к≥§мХљ лУ±мЭД лБУлКФ мЮ•кµ≠мЧР лД£мЦі мЭµнЮМ
мЪФл¶ђ мЭіл¶ДмЭімІА, мЦілђµ кЈЄ мЮРм≤іл•Љ к∞Ал¶ђнВ§лКФ к≤ГмЭі мХДлЛИлЛ§. мШ§лОЕмЭД мЦілђµмЬЉл°Ь мИЬнЩФнХЬлЛ§лКФ к≤ГмЭА
лґАлМАм∞Мк∞Ьл•Љ “
мЖМмЛЬмІА”лЭЉк≥† лґАл•ік≤†лЛ§лКФ к≤Гк≥Љ лЛ§л•Љ л∞Фк∞А мЧЖлКФ лДМмДЉмК§мЭілЛ§. м∞Єк≥†л°Ь мЦілђµмЭА мЭЉл≥ЄмЦіл°Ь “мК§л¶ђлѓЄ(гБЩгВКиЇЂ)”лЛ§.
вЖТ “лПДл¶ђ”лЭЉлКФ лІРмЭА “лПД놧лВілЛ§”мЭШ мЦімЫРмЬЉл°Ь, “лЛ≠мЭД лПД놧лВі лІМлУ† нГХ”мЭі “лЛ≠лПДл¶ђнГХ”мЭі лРШмЧИлЛ§лКФ мД§мЭі мЮИлЛ§. “лЛ≠мГИнГХ”мЭілЮА лІРмЭД мЭЉл≥ЄмЦіл°Ь мІБмЧ≠нХШл©і “лЛИмЩАнЖ†л¶ђнЖ†л¶ђнЖ†мЪ∞”(йґПй≥•жєѓ)лЭЉлКФ лІРлПД мХИлРШлКФ лЛ®мЦік∞А лРЬлЛ§. мЭі к≤љмЪ∞, мГИл°Ь лІМлУ† нГХмЭілЭЉмДЬ “гБ®гВК”к∞А лґЩмЧИлЛ§л©і кЄЄмІРмКємЭЄ нЖ†лБЉл•Љ мВђмЪ©нХЬ нЖ†лБЉлПДл¶ђнГХмЭА мЦілЦїк≤М мД§л™ЕнХ† к≤ГмЭЄмІАк∞А лђЄм†ЬмЭілЛ§.. мВђмЛ§ лЛ≠лПДл¶ђнГХмЭШ мЮРмДЄнХЬ мЦімЫРмЧР лМАнХімДЬлКФ
м†ДнША мЧ∞кµђк∞А лРШмЦімЮИмІА мХКмЬЉл©∞, мЭі мЪФл¶ђк∞А мЭЉл≥ЄмЧРмДЬ кЄ∞мЫРнЦИлЛ§к±∞лВШ мЭЉл≥ЄмЭШ мШБнЦ•мЬЉл°Ь мЪФл¶ђ л™Емє≠мЭі м†ХнХім°МлЛ§лКФ м¶Эк±∞лКФ
мЧЖлЛ§. лђімЧЗл≥ілЛ§лПД мЭЉл≥ЄмЧРмДЬлКФ
л≥Єк≥†мЮ•мЭЄ нХЬкµ≠ л∞ЬмЭМмЭД мµЬлМАнХЬ лФ∞лЭЉнХШ놧к≥† лŪ놕нХШмЧђ “лЛЈнЖ†л¶ђнГХ”(гВњгГГгГИгГ™гВњгГ≥)мЭілЭЉк≥† мУілЛ§.
кµ≠л¶љкµ≠мЦімЫРмЧРмДЬлКФ мЭЉл∞Шм†БмЭЄ мЭЄмЛЭлМАл°Ь нМРлЛ®нХШмЧђ лЛ≠л≥ґмЭМнГХ нОЄмЭД лУ§мЧИлЛ§(кµ≠мЦімЫРмЭі кЈЄл†Зк≤М нМРлЛ®нХШк≥† кЈЄк≤М мЭЉл∞ШнЩФлРЬ к≤ГмЭЉ мИШлПД мЮИмІАлІМ). нХШмІАлІМ лЛ≠л≥ґмЭМнГХмЭілЮА мЭіл¶Д кЈЄ мЮРм≤ілПД лђЄм†Ьк∞А мЮИлКФ к≤М, мЭЉлЛ® лЛ≠лПДл¶ђнГХмЭД лІМлУ§ лХМмЧР л≥ґлКФ к≥Љм†ХмЭі мХДмШИ мЧЖлЛ§.
#- к∞РмВђ(жДЯиђЭ)лКФ мЭЉл≥ЄмВђлЮМлУ§мЭі мВђмЪ©нХЬ мЦінЬШлЛ§?
вЖТ м§Скµ≠мЭШ м†ДкЈЉлМА лђЄнЧМмЧРлПД л≥імЭілКФ нСЬнШДмЭіл©∞ м°∞мД†мЩХм°∞мЛ§л°ЭмЧРлПД лУ±мЮ•нХЬлЛ§. лєИлПДмЭШ м¶Эк∞АлКФ мЭЉмЦімЭШ мШБнЦ•мЭЉ мИШ мЮИмІАлІМ мЫРлЮШ кµ≠мЦімЧР мЮИлНШ нСЬнШДмЭілЛ§.
- мЩХлЕА(зОЛе•≥)лКФ мЭЉл≥ЄмЧРмДЬ лІМлУ† м†Хм≤ілґИл™ЕмЭШ нХЬмЮРмЦімЭілЛ§?
вЖТ
м°∞мД†мЩХм°∞мЛ§л°ЭмЧРлПД лВШмШђ лњР мХДлЛИлЭЉ, м§Скµ≠мЭШ мЧ≠мВђмДЬмЭЄ
мВђлІИм≤ЬмЭШ
мВђкЄ∞,
мІДмИШмЭШ
мВЉкµ≠мІА лУ±мЧРлПД лІОмЭі лВШмШ§лКФ лІРмЭілЛ§. мЭЉл≥ЄмЧРмДЬлКФ мЩХлЕАлВШ к≥µм£ЉлЮА нХЬмЮРмЦі лМАмЛ† “
нЮИл©Ф(еІђ)”лЭЉлКФ к≥†мЬ†мЦіл•Љ лНФ мЮРм£Љ мУілЛ§. мЫРлЮШ
м≤ЬнЩ©м†ЬмЭікЄ∞ лХМлђЄмЧР мЩХ(зОЛ)мЭі лУ§мЦік∞АлКФ нСЬнШДмЭД мУЄ к±ілНХмІАк∞А мЧЖлЛ§. нЩ©лЕАлЭЉл©і л™®л•ЉкєМ.
- лВ≠лІМ(жµ™жЉЂ)мЭА л°ЬлІ®мК§(Romance)л•Љ мЭЉл≥ЄмЦіл°Ь л≤ИмЧ≠нХШл©імДЬ мШЃкЄі к≤ГмЬЉл°ЬмДЬ мЭљмЬЉл©і “л°ЬлІЭ”мЭілЭЉк≥† лІРмЭМмЭі лРЬлЛ§?
вЖТ кљ§лВШ мЬ†л™ЕнХЬ нД∞лђілЛИ мЧЖлКФ нЧЫмЖМлђЄ. кЈЄ мЭім†ДлґАнД∞ кµ≠лВімЧРмДЬ мИ±нХШк≤М мУ∞мЭЄ нСЬнШДмЭілЛ§. мШИл•Љ лУ§мЦі..
“мВ∞мЭі к∞АкєМмЪ∞лЛИ лВШлґАмВ∞(зЊЕжµЃе±±)мЭД кїімХИмЭА лУѓ. мЭі мДЄмГБмЧР мД†к≤љ(дїЩеҐГ)мЭімХЉ мЮИмЬЉлЮі. нХШлКШ мДЬм™љмЧР мҐЛмЭА к≥†мЭДмЭі мЮИлД§. к≥µлґА(еЈ•йГ® =лСРл≥і)мЭШ мЛЬнЭ• м∞ЄмЭД мИШ мЧЖмЦі, лХМлХМл°Ь лВ≠лІМ(жµ™жЉЂ)нХЬ лЖАмЭіл•Љ нХЬлЛ§лД§.вАЭ нХШмШАлЛ§. гАОмЛ†м¶ЭгАП мЪ∞мЧ∞лЛє(еПЛиУЃе†В) лПЩнЧМ(жЭ±иїТ) к≥БмЧР мЮИлКФлН∞, кµ∞мИШ м†ХмИЩмЭА(йД≠еПФеЮ†)мЭі мІАмЧИлЛ§. м≤≠мЛђлЛє(жЈЄењГе†В) к∞ЭкіА мДЬм™љмЧР мЮИлКФлН∞, кµ∞мИШ мЛђкіСлђЄ(ж≤ИеЕЙйЦА)мЭі мІАмЧИлЛ§.”, мЛ†м¶ЭлПЩкµ≠мЧђмІАмКєлЮМ(жЦ∞еҐЮжЭ±еЬЛиЉњеЬ∞еЛЭи¶љ) м†Ь42кґМ нЩ©нХілПД(йїГжµЈйБУ) лґАлґД.
нШємЭА..
л∞∞м£Љ(зЫГйЕТ)л°ЬмДЬ м†Ьл≤Х м†ДкіС(й°ЪзЛВ)мЭД мЭЉмВЉк≥† мЫРк≤∞(еЕГзµР)мЭШ к≥ДмВ∞(жЇ™е±±)мЧР нЧЫлРШмЭі лВ≠лІМ(жµ™жЉЂ)лІМмЭД мЭЉмїђмЬЉлЛИ, нЧИл¶ђмЧРлКФ мШ§м≤ЩмЭШ мЭЄлБИлПД лУЬл¶ђмЪ∞мІА л™їнХШмШАк≥†, л®Єл¶ђмЧРлКФ мВЉлЯЙ(дЄЙжҐБ)мЭШ к∞РнИђлПД мУ∞мІА л™їнХШмШАмЬЉлЛИ, лђЉмЭД мЮГмЭА мЪ©мЭімЧИлНШк∞А”, лПЩлђЄмД† 59кґМ
лЛ®, “л°ЬлІЭ”мЭД “мЭімГБ”мЭілВШ “мґФкµђнХШлКФ л∞Ф”, “мЭіл£®к≥†мЮР нХШлКФ књИ”мЭШ мЭШлѓЄл°Ь мУ∞лКФ к≤ГмЭА мЭЉл≥ЄмЛЭ нСЬнШДмЭілЛ§. лШРнХЬ мЭіл•Љ лВ≠лІМмЬЉл°Ь лМАм≤інХШ놧к≥† лУЬлКФ к≤Г мЧ≠мЛЬ м†Бм†ИмєШ л™їнХШлЛ§. (мШИ: лВ®мЮРмЭШ л°ЬлІЭ вЖТ лВ®мЮРмЭШ лВ≠лІМ) мЭЄнД∞лДЈ мЖНмЦілВШ мШ§лНХк≥ДмЧРмДЬлКФ мЭЉл≥ЄмЦімЭШ л°ЬлІЭк≥Љ лєДмКЈнХЬ лЬїмЬЉл°Ь мУ∞мЭілКФ к≤љмЪ∞лПД мЮИлКФлН∞ лВ≠лІМмЭілЮА лЛ®мЦілКФ м§Скµ≠мЧРмДЬ лУ§мЧђмШ® лЛ®мЦімІА мШБмЦі romanceл•Љ л≤ИмЧ≠нХШл©імДЬ лІМлУ§мЦімІД лЛ®мЦік∞А м†ИлМА мХДлЛИлЛ§. мЪ∞мЧ∞нЮИ л∞ЬмЭМмЭі лєДмКЈнХЬ к≤Г лњР.
- мЭЄлѓЉмЭілЮА лІРлПД мЭЉл≥ЄмЭі лІМлУ† нСЬнШДмЭілЛ§?
вЖТ мЧДм≤≠лВШк≤М нЭФнХШк≤М мУ∞мШАлНШ нСЬнШДмЭілЛ§. мШ§нЮИ놧
кµ≠лѓЉ м™љмЭі лВ®нХЬ міИкЄ∞мЧР мЦµмІАл°Ь лБМмЦілЛ§ мУі лЛ®мЦі.
3.1мЪілПЩ лЛємЛЬмЧРлПД нХЬкµ≠мЭЄлѓЉ мЪімЪінХШлКФ лЛ®мЦік∞А лІОмЭі мУ∞мШАлЛ§. лЛ§лІМ нШДлМА
м†ХмєШнХЩмЭілВШ
мВђнЪМнХЩмЧРмДЬ мУ∞лКФ к∞ЬлЕРмЭШ мЭЄлѓЉ, м¶Й
мШБмЦімЭШ peopleмЭілВШ
лПЕмЭЉмЦімЭШ volks,
мЭінГИл¶ђмХДмЦімЭШ popoloмЧР лМАмЭСлРШлКФ лЛ®мЦіл°ЬмДЬмЭШ мЭЄлѓЉмЭА мВђнЪМлВШ м†ХмЭШмЩА лІИм∞ђк∞АмІАл°Ь мЭЉл≥ЄмЧРмДЬ л≤ИмЧ≠нХЬ лІРмЭА лІЮлЛ§. лђЄм†ЬлКФ мЭік≤Гл≥ілЛ§ лНФ лВШмЭА л≤ИмЧ≠мЭД нХЬкµ≠мЧРмДЬ лІМлУ§мІА л™їнХШк≥† мЮИлЛ§лКФ к≤Г. кЈЄл¶ђк≥† мВђл£МлУ§ л≥іл©і мЭЄлѓЉмЭілЭЉлКФ лІРлПД мУ∞мЧђмЮИлЛ§. мІХлєДл°ЭмЧРмДЬлПД мЭЄлѓЉмЭілЭЉлКФ нХЬмЮРмЦік∞А мЮИлЛ§. мЙљк≤М лІРнХі
кµ≠лѓЉмЭА мШБмЦімЭШ NationalмЧР лМАмЭСнХШлКФ “лѓЉм°±”мЭШ мЭШлѓЄмЧР лНФ к∞ХнХЬ лЛ®мЦілЭЉл©і, мЭЄлѓЉмЭА peopleмЧР лМАмЭСлРШлКФ лЛ®мЦі.
- к≥µнЩФкµ≠мЭілЮА лІРлПД мЭЉл≥ЄмЭі лІМлУ§мЧИлЛ§?
вЖТ мВђмЛ§ “к≥µнЩФ(еЕ±еТМ)”лЭЉлКФ лІР мЮРм≤ілКФ
м£ЉлВШлЭЉ лХМлґАнД∞ мУ∞мШАлНШ нСЬнШДмЭілЛ§. нХШмІАлІМ, мЪ∞л¶ђк∞А мХМк≥† мЮИлКФ “к≥µнЩФкµ≠”мЭілЮА к∞ЬлЕРмЭА мЭЉл≥ЄмЧРмДЬ лІМлУ§мЦімІД к≤М лІЮлЛ§. м°∞мЦі л∞©мЛЭмЭА “еЕ±еТМвЖТ кµ∞м£Љк∞А мЧЖмЭМвЖТ к≥µк≥µ(еЕђеЕ±)мЭШ лВШлЭЉвЖТ Res Publica(”к≥µк≥µмЭШ к≤Г”мЭілЭЉлКФ лЬїмЭШ лЭЉнЛімЦі)вЖТ лФ∞лЭЉмДЬ Republic вЙТ к≥µнЩФкµ≠”
- ”мЧРлИДл¶ђ”лЮА лІРлПД мЭЉл≥ЄмЭі лІМлУ§мЧИлЛ§?
вЖТ мШЫлВ†лґАнД∞ мЮШлІМ мУ∞мЭілНШ к≥†мЬ†мЦілЛ§. мЭік±Є мЮШл™ї мХМмХДмДЬ к∞Ак≤М нХШлВШ лІЭнХШк≤М лІМлУ† мВђл°АлПД мЮИлЛ§к≥† нХЬлЛ§.
нЭ†мҐАлђі.
- ”кµђлСР”лЭЉлКФ лІРлПД мЭЉл≥ЄмЦімЧРмДЬ мЬ†лЮШнХЬ лЛ®мЦімЭілЛ§?
вЖТ мЭЉл≥ЄмЦіл°Ь мЛ†л∞ЬмЭД мЭШлѓЄнХШлКФ гБПгБ§(йЭі)мЩА л∞ЬмЭМмЭі лєДмКЈнХімДЬ лВШмШ® м£ЉмЮ•. кЈЄлЯ∞лН∞ мВђмЛ§мЭА мЫРлЮШ
л∞±м†ЬмЛЬлМАлґАнД∞ мУ∞мЭілНШ лІРмЭімЧИлЛ§. л∞±м†ЬмЦік∞А мЭЉл≥ЄмЦіл°Ь к±ілДИк∞ФмЭД к∞АлК•мД±мЧР лМАнХімД† мХМ놧мІД л∞Ф мЧЖлЛ§. к≤∞м†Хм†БмЬЉл°Ь, кµ≠л¶љкµ≠мЦімЫРмЭА кµђлСРл•Љ к∞Хм†РкЄ∞лХМ лДШмЦімШ® мЪ©мЦілЭЉ мЭЄм†ХнХЬм†БмЭі мЧЖмЬЉл©∞, мШ§нЮИ놧
мЧ≠мЬЉл°Ь лЛ®нЩФ(зЯ≠йЭі)л•Љ “кµђлСР”л°Ь мИЬнЩФнХімХЉ нХЬлЛ§лЭЉк≥† м†Бк≥† мЮИлЛ§. мВђмЛ§мГБ кµђлСРл•Љ мЭЄм†ХнХШлКФ мЕИ.
- мВ∞л≥і(жХ£ж≠•)лКФ мЭЉл≥ЄмЛЭ нХЬмЮРмЦімЭілЛ§?
вЖТ нХЬмЮРлђЄнЩФкґМмЧРмДЬ к≥µнЖµмЬЉл°Ь мВђмЪ©нХШлНШ лЛ®мЦілЛ§. м§Скµ≠мЭілВШ мЪ∞л¶ђлВШлЭЉмЭШ нХЬмЛЬмЧР мИ±нХШк≤М л∞Ьк≤ђлРШлКФ мВ∞л≥ілЭЉлКФ лЛ®мЦілУ§мЭі л™ЕнЩХнХЬ м¶Эк±∞к∞А лРЬлЛ§.
нЩШлє†лУ§мЭА лШР мЭЉл≥ЄмЭі м°∞мЮСнЦИлЛ§к≥† нХШк≤†мІА м†ХмЮС к∞Хм†РкЄ∞мЧР мВ∞л≥іл≥ілЛ§ к≥†кЄЙнХШк≤М мЭЄмЛЭлРЬ лЛ®мЦілКФ нХШмЭінВємЭілВШ м°∞кєЕмЭімЧИлЛ§.
кЈЄ лЛємЛЬ мВђлЮМлУ§мЭі мЩЄкµ≠мЦіл•Љ л™їнЦИмЭД к±∞лЭЉк≥† мГЭк∞БнХШмІАлІИвЖТ
EBS к∞ХмЭШмЧР лВШмШ® мЭілЮШ мЬ†л™ЕнХімІД мШ§нХімЭЄлН∞, кЉ≠ кЈЄл†ЗмІАлКФ мХКлЛ§.
1941лЕД ”кµ≠лѓЉнХЩкµРл†є”мЬЉл°Ь мЮђм†ХлРШмЦі
мЖМнХЩкµРлЭЉлКФ мЭіл¶ДмЭД лМАм≤інХШк≤М лРЬ “кµ≠лѓЉнХЩкµРл†є”мЭШ кµ≠лѓЉнХЩкµРлКФ
лПЕмЭЉ м†Ь2м†Ькµ≠к≥Љ
м†Ь3м†Ькµ≠кЄ∞мЧР мУ∞мЭЄ
лПЕмЭЉмЦі нПінБђмК§мКРл†И(Volksschule)мЭШ мІБмЧ≠л™ЕмЭілЛ§. лђЉл°† лЛємЛЬ кµ≠лѓЉнХЩкµРл†ємЭА
лВШмєШмЭШ нПінБђмК§мКРл†И кіА놮 л≤ХмЭШ лВімЪ©мЭД мГБлЛєлґАлґД к∞Ам†ЄмЩФмЬЉл©∞, кµ≠лѓЉкµ≠к∞А, лВШмХДк∞А
кµ∞кµ≠м£ЉмЭШмЩА
м†Дм≤ім£ЉмЭШл•Љ к∞Хм°∞нХШлНШ нЩ©кµ≠мЛ†лѓЉнЩФкµРмЬ°мЭШ мВ∞лђЉмЮДмЭА лґАм†ХнХ† мИШ мЧЖлЛ§. кЈЄл†ЗкЄ∞мЧР мЭЉл≥ЄмЭА
1947лЕД кµ≠лѓЉнХЩкµРлЭЉлКФ мЭіл¶ДмЭД нПРмІАнХШк≥† лЛ§мЛЬ
мЖМнХЩкµРл°Ь лПМмХДк∞ФмЬЉл©∞, лґБнХЬмЭА
мЭЄлѓЉнХЩкµРлЭЉлКФ мЭіл¶ДмЭД мНЉк≥†, кЈЄл¶ђк≥† нХЬкµ≠мЭА кљ§ мДЄмЫФмЭі нЭРл•Є 1996лЕДмЧР мЩАмДЬмХЉ
міИлУ±нХЩкµРлЭЉлКФ мЭіл¶ДмЭД мВђмЪ©нЦИлЛ§.
мЖФмІБнЮИ мЭЉм†ЬмЮФмЮђл≥ілЛ§ лВШмєШмЮФмЮђк∞А лНФ лђімДЬмЪік±∞ мХДлЛЩлЛИкєМ мХДмЪ∞мКИлєДмЄ†лВШ 731лґАлМАлВШлђЉл°† мЭі м†ДмЛЬм≤ім†Ь нХШмЭШ кµ≠лѓЉнХЩкµРл†ємЭШ лВімЪ©мЭД л≥іл©і м†ДнШХм†БмЭЄ
нЩ©кµ≠мЛ†лѓЉнЩФ кµРмЬ°мЭД мІАнЦ•нХШк≥† мЮИлЛ§. м†ДмЛЬм≤ім†ЬмЭШ мКєл¶ђл•Љ мЬДнХі м≤імЬ°к≥Љл™©, мЛ§мЧЕк≥Љл™©мЭД к∞ХнЩФнЦИк≥†,
м°∞мД†мЦіл•Љ мЩДм†ДнЮИ нПРмІАнЦИмЬЉл©∞,
мЛ†мВђ м∞Єл∞∞лКФ лЛ®к≥® лІ§лЙі. лФ∞лЭЉмДЬ кµ≠лѓЉнХЩкµРмЧР нЩ©кµ≠мЛ†лѓЉмЭШ м§ДмЮДлІРмЭілЭЉ нХ®мЭА мХДм£Љ нЛАл†ЄлЛ§к≥† л≥Љ мИШлКФ мЧЖлЛ§. мХ†міИмЧР мЭЉм†Ьк∞Хм†РкЄ∞мЭШ мЮФмЮђлУ† лПЕмЭЉм†Ькµ≠ мЮФмЮђлУ† мХ†міИмЧР лСШмЭШ м∞®мЭілКФ л≥Дл°Ь мЧЖлЛ§. кµРмЬ°мЭШ кµ≠к∞АмЧР мЭШнХЬ мҐЕмЖНмЭілЮА мЄ°л©імЧРмДЬ мЧ∞мЮ•мД†мГБмЧР мЮИлКФ
м†Дм≤ім£ЉмЭШм†Б нСЬнШДмЭілЮА к≤ГмЭД лґАм†ХнХ† мИШ мЧЖкЄ∞ лХМлђЄмЭілЛ§. (нХЬкµ≠мЭШ л∞Шк≥µкµ∞мВђм†ХкґМлПД нПђнХ®нХімДЬ лІРмЭілЛ§.)
- л∞±мД±мЭД лЬїнХШлКФ лѓЉміИ(ж∞СиНЙ)лКФ мЭЉл≥ЄмЛЭ нХЬмЮРмЦімЭілЛ§?
вЖТ м°∞мД†мЛЬлМА лђЄмІСмЧРлПД лУ±мЮ•нХШлКФ нСЬнШДмЭілЛ§. м°∞мД† міИкЄ∞мЭШ нХЩмЮРмЭЄ кґМкЈЉмЭі к∞Ькµ≠к≥µмЛ† м°∞м§АмЭД м∞ђмЦСнХЬ мЛЬмЧР
ж∞СиНЙжЬЫйЬЦйЫ® зБЉзߕ姩еСљж≠Є(лѓЉміИлУ§мЭі лЛ®лєДл•Љ л∞ФлЭЉлУѓ нХШмШАк±∞лЛИ м≤Ьл™ЕмЭі лПМмХДк∞АлКФ к≤ГмЭД мХМмХШмЬЉлѓАл°Ь)лЭЉлКФ нСЬнШДмЭі лВШнГАлВШл©∞ мД±мҐЕ лХМмЭШ нХЩмЮРмЭЄ мЭімДЭнШХмЭШ лђЄмІС “м†АнЧМлђЄмІС”мЧРлПД
ж∞СиНЙеЈ≤еЊЮ饮иНЙеБГлЭЉлКФ нСЬнШДмЭі лВШнГАлВЬлЛ§. мЭі нСЬнШДмЭА м§Скµ≠мЭШ к≥†м†Д мЛЬк≤љмЭШ иНЙдЄКдєЛ饮иНЙењЕеБГ и™∞зߕ饮дЄ≠иНЙеЊ©зЂЛ(міИмГБмІАнТНміИнХДмЦЄ мИШмІАнТНм§СміИлґАл¶љ: нТА мЬДл°Ь л∞ФлЮМмЭі лґИл©і нТАмЭА л∞ШлУЬмЛЬ лИХлКФлЛ§. лИДк∞А мХМлЮі, нТАмЭА л∞ФлЮМмЖНмЧРмДЬлПД лЛ§мЛЬ мЭЉмЦілВШк≥† мЮИлЛ§лКФ к≤ГмЭД)мЭілЭЉлКФ нСЬнШДмЭД мЦіл†ИмЭЄмІАнХЬ нСЬнШДмЭілЛ§.
- мВ∞кЉ≠лМАкЄ∞лЭЉлКФ мЭШлѓЄмЭШ м†ХмГБ(й†ВдЄК)мЭілЭЉлКФ лЛ®мЦілКФ мЭЉл≥ЄмЛЭ нХЬмЮРмЦілЛ§?
вЖТ к≥†л†§ лІРмЧљлґАнД∞ мЮШлІМ мУ∞мЭЄ нХЬмЮРмЦілЛ§. мЮРмДЄнХЬ к≤ГмЭА
м†ХмГБ нХ≠л™© м∞Єк≥†.
- лМАнХШ(е§ІиЭ¶)лКФ мЭЉл≥ЄмЦі мШ§-мЧРлєД(гБКгБКгБИгБі)мЭШ мЭЉл≥ЄмЛЭ нХЬмЮР нСЬкЄ∞мЭілѓАл°Ь “мЩХмГИмЪ∞”л°Ь мИЬнЩФнХімХЉ нХЬлЛ§?
вЖТ лМАнХШлЭЉлКФ лЛ®мЦі мЧ≠мЛЬ м°∞мД†мЛЬлМА кЄ∞л°ЭмЧР мИ±нХШк≤М лВШмШ®лЛ§. нКємВ∞нТИмЬЉл°Ь лМАнХШл•Љ л∞Фм≥§лЛ§лКФ к≥µлђЄмДЬмЧР е§ІиЭ¶лЭЉлКФ лЛ®мЦіл•Љ мУ∞к≥† мЮИмЬЉл©∞, лПЩкµ≠мЧђмІАмКєлЮМмЧРмДЬ к∞Б мІАмЧ≠мЭШ нКємВ∞нТИмЭі лМАнХШлЭЉк≥† мЖМк∞ЬнХШлКФ кЄ∞л°ЭмЧРмДЬлПД м†ЬлМАл°Ь е§ІиЭ¶лЭЉк≥† нСЬкЄ∞нХШк≥† мЮИлЛ§. кЈЄл¶ђк≥† мЭЉл≥ЄмЦімЧРмДЬлКФ
лЛ§мЭімЗЉ мЛЬлМАмЧР м≤ШмЭМ л®єкЄ∞ мЛЬмЮСнЦИлЛ§к≥† нХімДЬ нГАмЭімЗЉмЧРлєД(е§Іж≠£жµЈиАБ)лЭЉлКФ лІРмЭД мУілЛ§.
- лПДнХ©(йГљеРИ)мЭА мЭЉл≥ЄмЦі гБ§гБФгБЖмЭШ нХЬмЮРнСЬкЄ∞мЭілѓАл°Ь “нХ©к≥Д” лУ±мЬЉл°Ь мИЬнЩФнХімХЉ нХЬлЛ§?
вЖТ
мКєм†ХмЫРмЭЉкЄ∞лВШ м°∞мД†мЩХм°∞мЛ§л°Э, мЭЉмД±л°ЭмЧРлПД лУ±мЮ•нХШлКФ нСЬнШДмЭіл©∞ мЦілЦ§ лђЉнТИлУ§мЭШ міЭнХ©мЭД нСЬмЛЬнХ† лХМ мВђмЪ©нХЬ нХЬмЮРмЦілЛ§.
зХЩжЬђйБУжЗЙ絶еА≠дЇЇдєЛжХЄдЄАеНГеРМ, зіНжЬђжЫєжЗЙзИ≤зґУи≤їдєЛзФ®иАЕеЫЫзЩЊй§ШеРМ, еЫ†еВ≥жХОеИЖдїШ, и≤њйКАдєЛжХЄеЫЫдЇФзЩЊеРМ, йГљеРИдЇМеНГеЕ≠зЩЊй§ШеРМ
л≥ЄлПДмЧР лВ®к≤®лСРмЧИлЛ§к∞А мЩЬмЭЄлУ§мЧРк≤М мІАкЄЙнХімХЉ нХ† 1м≤Ь лПЩ, л≥Єм°∞к∞А л∞ЫмХДлУ§мЧђ к≤љлєДл°Ь мН®мХЉ нХ† к≤Г 4л∞±мЧђ лПЩ, м†ДкµРл°Ь лґДлґАнХШмЛ† лН∞мЧР лФ∞лЭЉ мЭАмЭД лђімЧ≠нХ† лМАкЄИ 4, 5л∞± лПЩ лУ± лПДнХ© 2м≤Ь 6л∞±мЧђ лПЩмЧР лЛђнХ©лЛИлЛ§., м°∞мД†мЩХм°∞мЛ§л°Э кіСнХікµ∞мЭЉкЄ∞ 1618лЕД 4мЫФ 12мЭЉ кЄ∞мВђмЧР нШЄм°∞мЧРмДЬ мШђл¶∞ л≥ік≥†
- мХ†лІ§нХШлЛ§лКФ мЭЉл≥ЄмЛЭ нХЬмЮРмЦімЭілЛИ л™®нШЄнХШлЛ§к≥† мН®мХЉнХЬлЛ§?
вЖТ кЈЉк±∞мЧЖмЭі мЩЬк≥°лРЬ м£ЉмЮ•. “мХ†лІ§(жЫЦжШІ)”мЩА мИЬмЪ∞л¶ђлІР “мХ†лІ§”к∞А мЮИмЬЉл©∞ мЭШлѓЄк∞А м°∞кЄИ лЛ§л•ілЛ§. нХЬмЮРмЦі(жЫЦжШІ)лКФ нЭђлѓЄнХШмЧђ нЩХмЛ§нХШмІА л™їнХЬ к≤ГмЭД лІРнХШк≥† мИЬмЪ∞л¶ђлІР “мХ†лІ§”лКФ “мХ†књОлЛ§,мЦµмЪЄнХШлЛ§”лЭЉлКФ лЬїмЬЉл°Ь мУ∞мЭЄлЛ§. нХЬмЮРмЦі(жЫЦжШІ)мЭШ к≤љмЪ∞ мЛ§л°ЭмЧРмДЬлПД мЮРм£Љ лВШмШ§лКФ нСЬнШДмЭілЛ§.
еЙНжЧ•дЄКи®АиБљзіНдєЛи™™, зН≤иТЩеЕ™еЕБгАВ йЫЦиЗ£з≠Йи≠ШжЈЇжЙНзЦО, и±ИжХҐдї•жЫЦжШІдєЛи™™, дї∞еє≤иБ∞иБљ?
вАЬм†ДмЭЉмЧР мГБмЦЄ(дЄКи®А)нХЬ л∞Ф, к∞ДмЦЄ(иЂЂи®А)мЭД лУ§мЦім£ЉмЦімХЉ лРЬлЛ§лКФ мД§(и™™)мЭА мЬ§нЧИ(еЕБи®±)л•Љ мЦїмЧИлКФлН∞, лєДл°Э мЛ† лУ±мЭі к≤ђмЛЭмЭі мЦХк≥† мЮђм£Љк∞А мУЄл™®мЧЖмІАлІИлКФ, мЦім∞М к∞РнЮИ мХ†лІ§(жЫЦжШІ)нХЬ лІРл°ЬмН® мЪ∞лЯђлЯђ мЮДкЄИмЧРк≤М лУ£кЄ∞л•Љ мЪФкµђнХШк≤†мКµлЛИкєМ? м°∞мД†мЩХм°∞мЛ§л°Э нГЬм°∞ 2кґМ, 1лЕД(1392 мЮДмЛ† / л™Е нЩНлђі(жі™ж≠¶) 25лЕД) 11мЫФ 14мЭЉ(мЛ†лђШ) кЄ∞мВђ
мХ†міИмЧР мХ†лІ§мЩА л™®нШЄ лСШ лЛ§ мХДм£Љ мЮСмЭА мИШл•Љ к∞Ал¶ђнВ§лКФ лґИкµРмЪ©мЦілЛ§.
* лЖНмХЕмЭА мЭЉм†Ьк∞А м°∞мД† мЭМмХЕмЭД м≤ЬлМАнХімДЬ лІМлУ† лІРмЭілЛ§?
нХЬлПЩмХИ нХЩк≥ДмЧРмДЬлПД лЖНмХЕмЭілЮА лВ±лІРмЭі 1936лЕД мЭЉл≥ЄмЭЄ нХЩмЮР лђілЭЉмХЉлІИ мІАм§АмЭШ “лґАлЭљм†Ь”мЧРмДЬ м≤ШмЭМ лВШмЩФлЛ§к≥† мХМ놧솪 мЮИмЧИлЛ§.
лШРлКФ мЭЉл≥Є м†ДнЖµ нГИкЈємЭЄ лК•мХЕ(иГљж®ВлЕЄмєімњ†)мЭД мЧ∞мЫРмЬЉл°Ь нХЬ мЭЉл≥ЄмЛЭ мЭМмХЕм°∞мЦіл°Ь лІМлУ§мЦім°МлЛ® м£ЉмЮ•лПД мЮИмЧИлЛ§.
нХШмІАлІМ 18мДЄкЄ∞ лђЄмЭЄ мШ•мЖМ кґМмІСмЭШ лђЄмІС
”лЖНмХЕмЭА нОЄмХИнХШлЛ§. лШРнХЬ л™®лСРмЭШ мЭМмХЕмЭі к∞БкЄ∞ м†Им£Љк∞А мЮИк≥†, м°∞л¶ђк∞А мЮИлЛ§. лВЬмЮ°нХЬ лУѓнХШмЧђлПД лВЬмЮ°нХШмІА мХКлЛ§. лВШлКФ к≥І лЖНмХЕк≥Љ кµ∞мХЕмЭД мЛђнЮИ м¶Рк≤®нХЬлЛ§.”
1890лЕД нЩ©нШДмЭШ лІ§м≤ЬмХЉл°Э
”лМАк∞Ь мЛЬк≥®мЧРмДЬлКФ мЧђл¶Дм≤†мЧР лЖНлѓЉлУ§мЭі мІХк≥Љ кљєк≥Љл¶ђл•Љ мєШл©імДЬ лЕЉмЭД лІЄлЛ§. мЭік≤ГмЭД лЖНмХЕмЭілЭЉк≥† нХЬлЛ§.”
1894лЕД мґ©лВ® мДЬм≤ЬмЭШ мЬ†мГЭ мµЬлНХкЄ∞к∞А мУі мЭЉкЄ∞мЧРмДЬлПД “мХЉмВЉк≤љмЧР лІИмЭД мВђлЮМлУ§мЭі лЖНмХЕмЭД нБђк≤М мЪЄл¶ђл©∞ лІРнХШкЄ∞л•Љ л™®лСР нХЬ лђіл¶ђл•Љ мЬ†мІАнХі к∞АлЭљмХФмЬЉл°Ь к∞АмДЬ нЩФм†БмЭД лђЉл¶ђмєШмЮРк≥† нЦИлЛ§”
лУ± лЖНмХЕмЭА м°∞мД†мЛЬлМАлґАнД∞ мЭілѓЄ л≥інОЄнЩФлРЬ лЛ®мЦілЛ§. мІАмЧ≠мЧР лФ∞лЭЉ нТНлђЉ(饮зЙ©),нТНмЮ•,лІ§кµђ,кµњ,лСРл†И,к±ЄкґБ,к±Єл¶љ мЧђлЯђ мЭіл¶ДмЬЉл°Ь лґИл†ЄмІАлІМ лЛємЛЬ мВђлМАлґАлУ§мЭШ лђЄнЧМмЧРлКФ лЖНмХЕмЭі м£Љл°Ь лІОмЭі мУ∞мЭЄ нОЄ.